지난 이야기에서 우리는 대한제국이 을사늑약을 거부했다면 어땠을까를 상상했었죠.
이번엔 시간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조선 후기, 가장 빛났지만 가장 아쉬운 임금 한 사람을 떠올려봅니다.
그 이름, 바로 정조.
만약 그가 조금만 더 오래 살았더라면.
그리고 그의 개혁이 끝까지 이어졌더라면—
조선은, 아니 우리는 지금과는 다른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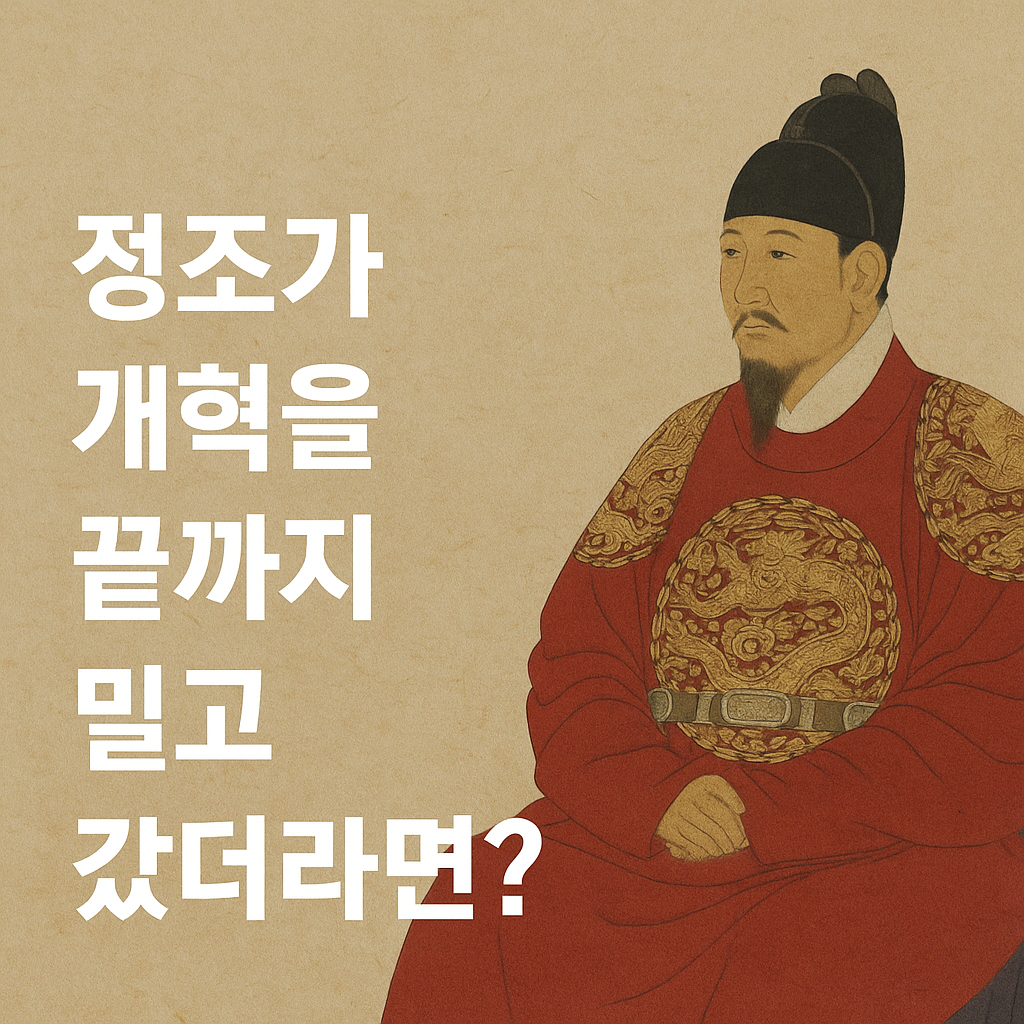
🏛 개혁의 심장, 정조
정조는 단순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꿈을 품은 정치가였고,
변화를 주저하지 않은 사상가였으며,
무엇보다 조선을 사랑한 아들이자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무너져가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규장각을 만들고, 초계문신을 길렀으며,
소외된 신분이던 서얼에게도 기회를 주었습니다.
또한 그는 수원 화성이라는 도시를 통해
경제, 군사, 행정의 새로운 실험장을 만들었죠.
그가 진짜 원했던 것은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조선,
탐관오리가 아닌 실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는 조선,
그리고 백성이 나라의 주인인 조선이었을지도 모릅니다.
🤚 정조가 추진한 주요 개혁
✅ 탕평정치의 완성
- 할아버지 영조가 시작한 탕평책(붕당 간 균형 정치)을 이어받아
더욱 실질적인 인재 등용과 권력 균형을 시도 - 소수 세력(남인, 서인 등)의 인재도 적극 기용해 조정의 다양성 확보
✅ 규장각 설치 (1776년)
- 젊고 유능한 학자들을 뽑아 정책 자문기관 + 연구기관으로 활용
- 홍대용, 박제가, 이덕무, 유득공 등 실학자들을 중심으로 한 개혁 사상 지원
- 정조의 브레인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 초계문신제
- 젊은 관료들을 다시 교육해 엘리트 집단 양성
- 단순한 문벌 대신 실력을 중시하는 시스템
✅ 수원 화성 건설 (정치+군사적 실험)
- 단순한 군사 요새가 아니라,
경제 활성화, 상업 확대, 군제 개편의 시험장이었음 - *“새로운 수도 가능성”*으로 평가되기도 함
✅ 서얼 허통 제한 완화
- 신분이 낮은 서얼 출신도 과거시험이나 관직에 오를 수 있도록 확대
- 조선의 봉건적 신분제 해체를 꿈꾼 첫 왕
✅ 금난전권 철폐
- 육의전 등 시전 상인의 독점권 폐지
- 자유 상업을 보장하고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려 함
- 소상인과 상공업 진흥에 긍정적 영향
✅ 장용영 설치 (친위 군대)
- 기존 훈련도감 외에 자신의 정치기반을 지킬 수 있는 군사력 확보
- 노론의 견제를 의식한 자구책으로도 해석됨
🔮 끝까지 밀고 갔더라면…
만약 정조가 10년, 20년 더 살았다면
그의 개혁은 꽃을 피웠을까요?
● 서얼 출신의 인재들이 더 많이 기용되고
● 상공업이 진흥되며 자본이 축적되고
● 지역 기반이 수도권 중심에서 분산되고
● 노론 일당 중심이 아닌 다양성 있는 정치가 자리 잡고
● 실학이 단순한 철학이 아닌 국가 운영의 실제 원칙이 되었을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왕 중심이 아닌 조선판 입헌군주제의 씨앗이
이때부터 싹틀 수 있지 않았을까요?
정조는 혼자였지만,
그가 만든 시스템은 사람을 키우고,
그 사람이 다시 시스템을 바꾸는 구조였으니까요.
🧭 그랬다면, 조선은…
조선은 더 이상 폐쇄적인 유교 국가가 아닌,
개방적이고 유연한 실용의 나라로
근대를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정조의 개혁이 이어졌다면,
흥선대원군의 쇄국도,
세도정치의 타락도
한낱 지나가는 소문으로 끝났을지 모릅니다.
그렇게만 되었더라면…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 강점기까지 이어지는
그 고통의 역사에서
우린 조금은 더 단단하고 담대하게
우리를 지켜낼 힘을 가질 수 있었겠죠.
🌿 이어지는 상상의 한 걸음
정조는 단지 제도를 바꾸려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람’을 바꾸고 싶어 했죠.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그의 정치는 늘 이 믿음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접 책을 읽었고,
글을 쓰고, 질문하고, 토론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젊은 학자들을 옆에 두었죠.
그들의 생각을 기록하게 하고,
다시 묻고 또 다른 길을 찾게 했습니다.
그가 세운 규장각은 단지 도서관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하는 ‘국가 브레인’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생각이 머물다 가는 공간이 아니라,
공동의 사유와 정책의 실험실이었죠.
⏳ 그러나 그는 너무 빨리 떠났습니다.
1800년, 향년 49세.
정조가 갑작스레 세상을 떠난 뒤,
그의 뒤를 이은 아들 순조는 너무 어렸고,
결국 권력은 다시 노론의 손으로 돌아가 버렸죠.
그가 뿌린 씨앗은 싹을 틔우기도 전에 밟혔고,
그가 남긴 개혁의 설계도는
오래 펴보지 못한 채
역사의 서랍 속에 접혀버렸습니다.
세도정치, 매관매직, 기득권의 귀환…
정조가 애써 멈추려 했던 것들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 그럼에도 우리가 상상해야 하는 이유
비록 현실은 그렇게 흘러갔지만,
우리는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단 10년만 더 살았다면,
그가 키운 인재들이 자리를 잡고
제도를 지키는 담장을 세웠다면—
어쩌면
일제의 그림자가 조선을 덮기도 전에,
조선은 이미 ‘변화’를 통해
스스로를 지켜낼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는 조선이라는 이름의 끝에서
새로운 조선의 문을 두드렸던 사람입니다.
그 문이 열렸더라면,
우리는 다른 언어, 다른 역사,
다른 자긍심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 그리고 오늘, 다시 그 문을 두드려 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변화를 밀고 나가는 용기.
사람을 바꾸려는 믿음.
그리고 기록하고, 나누고, 이어가는 힘.
정조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은
바로 이 ‘사유의 자유로움’이 아닐까요?
오늘도 잠시 멈춰 서서,
그가 걸었던 길 위에
우리의 상상을 겹쳐봅니다.
이 조용한 상상이 당신의 하루에 작은 울림이 되길 바라며,
다음 역사 속 여행에서 또 뵙겠습니다.
'역사 속 가상 여행' 카테고리의 다른 글
| 📜 역사 속 가상여행 Ep.9 "세종과 정조의 개혁이 이어졌다면?" (6) | 2025.07.30 |
|---|---|
| 🕰 역사 속 가상여행 Ep.8 “세종대왕이 20년 더 살았다면?” (9) | 2025.07.29 |
| ⏰역사 속 가상여행 Ep.6 "대한제국이 일본의 불법적인 외교권 침탈, 을사늑약을 끝까지 거부했다면?" (5) | 2025.07.27 |
| 📘 역사 속 가상여행 Ep.5 《흥선대원군의 쇄국정책 없이 서양문화를 받아들였다면?》 (1) | 2025.07.27 |
| 🕊️ 역사 속 가상여행 ④조선시대에 천주교 박해가 없었다면, 우리 신앙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5) | 2025.07.26 |



